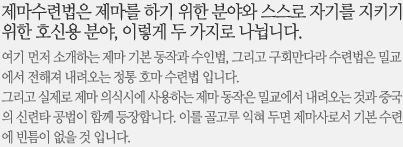청개구리 배꼽 빼는 명진스님
2007.07.25 10:08
부처님 배꼽도 빼놓고 ‘생활 화두’ 툭툭
[한겨레]
22일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고층빌딩 속 천년 고찰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오전 11시가 되자 법왕루의 넓은 법당이 입추의 여지가 없다. 법왕루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법당 밖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57)의 ‘경허스님 참선곡’ 세 번째 법회에 참석한 이들이다. 1970~80년대 선방에서 쉬는 시간에 경행을 하던 스님들이 한꺼번에 누군가를 빙 둘러 싸고 모여 있으면, 그가 바로 명진 스님이었다는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그에겐 늘 사람이 끌었다.
그렇더라도 선승들이나 하는 참선법회에 매회 1천여 명의 인파가 모여든다는 것은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그가 주지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봉은사의 법회에는 200명이 모인 적도 드물었다. 더구나 이 복 더위에. 명진 스님이 법상에 올랐다.
“덥죠?”
“예”
“어디가 더워요?”
“…”
“날씨가 덥습니까. 몸이 덥습니까. 마음이 덥습니까. 땀이 나니 땀구멍이 덥습니까. 덥다고 하는 그 놈이 어떤 놈입니까?”
단박에 사족을 잘라 버린 채 머리부터 내민다. 참나를 찾기 위한 화두가 ‘이뭣고’(이것은 무엇인가)만은 아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화두다. 불교란 물음의 종교라고 보는 명진 스님의 질문에 법왕루에선 바람 한 점 없는 적막이 흐른다. 더욱 덥다. 숨 막힌 보살(여성 불자)들의 얼굴이 간절히 한줄기 바람을 그리워한다. 그가 더욱 더 숨통을 조일 것인가, 과연 자비를 베풀 것인가.
갇힌 ‘선’ 아닌 삶의 현장서 의심 대상 찾아
저승과 지옥, 생의 고통도 해학으로 풀어내
“한국 여자들이 죽으면 염라대왕이 골치가 아프답니다. ”
질문을 받고 꿀 먹은 벙어리가 돼 고개를 숙였던 보살들이 명진 스님의 반전에 반색하며 고개를 쳐든다.
“저승에 올 사람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얼마나 깎고 밀고 성형을 했는지 주민등록증으로 아무리 대조해도 알아 볼 수가 없다는 거요!”
갑자기 “와!”하는 웃음소리로 한줄기 바람이 인다. 이어 이열치열이다.
“그 뿐이 아니요.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무진장 뜨거운 연옥인데,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찜질방에 단련이 됐는지, 그 열탕지옥에서 ‘아이고 시원하니 좋다 좋다’하면서 나오지를 않는 통에 정체돼 진도가 안나간다는거요.”
그 앞에서 저승과 지옥도 유머가 될 뿐이니 이제 생사법문조차 무용지물이다. 20대에 불과했던 30년 전 서울 수유동 화계사에서 욕쟁이 선사 춘성이 열반했을 때 춘성이 평소 즐겨 부르던 ‘나그네 설움’ 한가락을 뽑은 다음, 상가를 ‘전국 수좌(선승) 노래자랑대회’와 춤판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도 죽음이 어찌 고통이 아니었을 것인가. 그가 여섯 살 때 어머니는 자살했고, 3개월 뒤 재혼한 아버지 또한 그가 20대 때 세상을 등졌다. 그의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도 군에 가서 사고로 이승을 떠났다. 그런데도 그 기막힌 생의 아픔조차 천성이 밝은 그의 입을 거치면 생사마저 해학이 되고 만다.
“진짜 슬퍼봤소? 자식 읽은 어머니가 상청 앞에서 억지로 ‘아이고! 아이고!’하며 웁디까. 그렇게 안하더라도 밥을 먹다가도 울고, 잠을 자다가도 울컥 울음이 쏟아져 이불을 적시는 것이오. 그와 같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몰라 참으로 답답해 진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억지로 화두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까. 화두가 배급입니까. 타게. 화두가 보따리입니까. 챙기게.”
화두를 타고 화두를 챙기는 선가의 방식조차 그는 가볍게 베어버렸다. 그는 의심의 대상 또한 고서가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 찾도록 했다.
“부처님이 꽃을 든 것만 의심스럽습니까. 조주 선사가 왜 무(無)라고 했는지만 궁금합니까. 왜 저 밖에서 까마귀가 우는지 그것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법을 듣는 놈이 누군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방에 갇힌 선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선을 여는 그의 방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어진다. 한 보살이 그에게 반해 죽고 못살겠다고 하자, 그가 국립묘지의 동생 묘지에 데려가 “동생을 살려내면 보살 하자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 눈물로 돌아서는 보살에게 생사의 화두를 안겨준 그다.
참선 법회에 매회 1천여명 북적
7개월째 매일 1천배 ‘천일 기도’ 수행
참선 법회가 끝난 뒤 그의 처소로 올라갔다. 다래헌(茶來軒·차 마시러 오는 집)이다. 하지만 찻집의 틀에 갇혀있을 그가 아니다. “술마시는데는 도가 없고, 똥 누는데는 도가 없느냐”는 그다. 다만 이곳은 절이니 술을 마실 수 없어 차를 마실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7개월째 절 밖을 나가지 않고 매일 1천배씩 하고 있다. 천일기도다. 열여덟살에 대학입시공부를 하러 절간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선승으로부터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성철 선사에게 찾아간 뒤부터 선방 안팎을 들짐승처럼 휘젓고 다녔던 그에겐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 이제 그가 좀 달라졌을 것인지 은근히 한 질문을 던져본다.
“저는 여자를 안고 자고 일어나는데, 부대사(497~569)는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난다’(야야포불면 조조환공기·夜夜抱佛眠 朝朝還共起)고 합디다. 스님은 어떻습니까?”
“밤마다 망상으로 잠이 들고, 아침마다 망상과 함께 일어난다오.”
그가 안고 있는 것이 이미 티끌로 무화(無化)했다. 이제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하는 것 또한 망상이 되었다. 찌는 듯이 더운 지금 서울 강남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고 있다.
명진 스님은 누구?
‘역사 현장’ 함께 한 ‘청개구리 스님’
명진 스님은 삶의 궤적을 통해 그 유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청개구리과다. 1969년 해인사 백련암으로 성철 선사에게 찾아가 법명까지 받았지만, 불경을 공부하려면 일어를 공부하라고 하자, 공부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는 그날로 도망을 쳤다.
그는 5년 뒤 법주사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것도 다른 스님들은 그를 서로 상좌 삼으려 애쓰는데, 당시 주지였던 탄성 스님만 그를 ‘소 닭 보듯’하자, 굳이 탄성 스님의 상좌가 되겠다고 우겼다. 대부분의 선객들이 이름 난 선방에 이름 난 고승을 찾아가 수행할 때도 그는 충북 청원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재가자로 살아가는 ‘숨은 도인’ 여백우 처사에게 안거 때마다 찾아가 젊은날을 보내기도 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안달하는 문경 봉암사를 선승 외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산문 폐쇄를 해버린 일을 주도한 이도 그였다.
그는 85년 이곳 봉은사에서 열린 ‘10·27 법난(80년 신군부에 의해 절이 짓밟힌 사건) 규탄대회’로 감옥에 감으로써 ‘운동권 스님’으로 서막을 열었다. 그것도 감옥이 국가에서 밥먹여주고 독방까지 내주는 무문관(안에서 문을 폐쇄하고 참선 정진하는 방)이라기에 가보기를 자청한 것이었다.
그 후 그의 수행처소는 선방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한국 불교의 판도를 바꿔놓은 94년 종단 개혁 때는 수많은 비구·비구승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벗은 승복을 불전에 올린 뒤 “종단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대로 옷을 벗겠다”고 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스님들의 눈물을 쏟게 했다. 그것이 바로 종단 개혁의 시발이었다.
그는 2000년부터 조계종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과 본부장 등으로 대북 교류를 주도해왔다. 그런 그가 신도 20만의 부촌 강남의 대표적인 조계종 사찰인 봉은사 주지에 임명되자 신도들은 ‘좌익 두목’이 왔다며 경계심을 보였다. 더구나 그 자유분방한 삶의 궤적을 아는 이들은 그가 과연 대찰의 주지직을 해낼 수 있을지 의심했다.
그런 그가 막상 주지가 되자 적재적소에 인물들을 중용해 믿고 맡겼다. 마치 봉은사 주지직을 위해 출가 이후 40여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리고 지난달엔 박원순 희망제작소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봉은사 미래위원회’를 발족해 봉은사를 멋지게 꾸미고 강남의 허파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봉은’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주지가 된 직후 산문 밖엔 나가지 않겠다며 천일기도를 시작하자 뭇스님들은 “평생 다른 스님들 주머니만 털면서 살다가 이제 부촌의 대찰 주지를 맡아 놓고 밥도 안살라고 저런다”는 우스개 농담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찰의 주지가 직접 마당을 쓸고, 하루 세 번 빠짐 없이 예불을 주관하고, 산내 20여명의 스님들과 발우공양을 하는 것을 처음 본 신자들은 “저 분이 그 괴팍한 명진 스님이 맞느냐”면서 자신의 눈을 씻고 있다.
글·사진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2007년 7월 24일 제마법선사 전재
[한겨레]
22일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고층빌딩 속 천년 고찰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오전 11시가 되자 법왕루의 넓은 법당이 입추의 여지가 없다. 법왕루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법당 밖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57)의 ‘경허스님 참선곡’ 세 번째 법회에 참석한 이들이다. 1970~80년대 선방에서 쉬는 시간에 경행을 하던 스님들이 한꺼번에 누군가를 빙 둘러 싸고 모여 있으면, 그가 바로 명진 스님이었다는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그에겐 늘 사람이 끌었다.
그렇더라도 선승들이나 하는 참선법회에 매회 1천여 명의 인파가 모여든다는 것은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그가 주지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봉은사의 법회에는 200명이 모인 적도 드물었다. 더구나 이 복 더위에. 명진 스님이 법상에 올랐다.
“덥죠?”
“예”
“어디가 더워요?”
“…”
“날씨가 덥습니까. 몸이 덥습니까. 마음이 덥습니까. 땀이 나니 땀구멍이 덥습니까. 덥다고 하는 그 놈이 어떤 놈입니까?”
단박에 사족을 잘라 버린 채 머리부터 내민다. 참나를 찾기 위한 화두가 ‘이뭣고’(이것은 무엇인가)만은 아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화두다. 불교란 물음의 종교라고 보는 명진 스님의 질문에 법왕루에선 바람 한 점 없는 적막이 흐른다. 더욱 덥다. 숨 막힌 보살(여성 불자)들의 얼굴이 간절히 한줄기 바람을 그리워한다. 그가 더욱 더 숨통을 조일 것인가, 과연 자비를 베풀 것인가.
갇힌 ‘선’ 아닌 삶의 현장서 의심 대상 찾아
저승과 지옥, 생의 고통도 해학으로 풀어내
“한국 여자들이 죽으면 염라대왕이 골치가 아프답니다. ”
질문을 받고 꿀 먹은 벙어리가 돼 고개를 숙였던 보살들이 명진 스님의 반전에 반색하며 고개를 쳐든다.
“저승에 올 사람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얼마나 깎고 밀고 성형을 했는지 주민등록증으로 아무리 대조해도 알아 볼 수가 없다는 거요!”
갑자기 “와!”하는 웃음소리로 한줄기 바람이 인다. 이어 이열치열이다.
“그 뿐이 아니요.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무진장 뜨거운 연옥인데,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찜질방에 단련이 됐는지, 그 열탕지옥에서 ‘아이고 시원하니 좋다 좋다’하면서 나오지를 않는 통에 정체돼 진도가 안나간다는거요.”
그 앞에서 저승과 지옥도 유머가 될 뿐이니 이제 생사법문조차 무용지물이다. 20대에 불과했던 30년 전 서울 수유동 화계사에서 욕쟁이 선사 춘성이 열반했을 때 춘성이 평소 즐겨 부르던 ‘나그네 설움’ 한가락을 뽑은 다음, 상가를 ‘전국 수좌(선승) 노래자랑대회’와 춤판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도 죽음이 어찌 고통이 아니었을 것인가. 그가 여섯 살 때 어머니는 자살했고, 3개월 뒤 재혼한 아버지 또한 그가 20대 때 세상을 등졌다. 그의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도 군에 가서 사고로 이승을 떠났다. 그런데도 그 기막힌 생의 아픔조차 천성이 밝은 그의 입을 거치면 생사마저 해학이 되고 만다.
“진짜 슬퍼봤소? 자식 읽은 어머니가 상청 앞에서 억지로 ‘아이고! 아이고!’하며 웁디까. 그렇게 안하더라도 밥을 먹다가도 울고, 잠을 자다가도 울컥 울음이 쏟아져 이불을 적시는 것이오. 그와 같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몰라 참으로 답답해 진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억지로 화두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까. 화두가 배급입니까. 타게. 화두가 보따리입니까. 챙기게.”
화두를 타고 화두를 챙기는 선가의 방식조차 그는 가볍게 베어버렸다. 그는 의심의 대상 또한 고서가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 찾도록 했다.
“부처님이 꽃을 든 것만 의심스럽습니까. 조주 선사가 왜 무(無)라고 했는지만 궁금합니까. 왜 저 밖에서 까마귀가 우는지 그것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법을 듣는 놈이 누군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방에 갇힌 선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선을 여는 그의 방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어진다. 한 보살이 그에게 반해 죽고 못살겠다고 하자, 그가 국립묘지의 동생 묘지에 데려가 “동생을 살려내면 보살 하자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 눈물로 돌아서는 보살에게 생사의 화두를 안겨준 그다.
참선 법회에 매회 1천여명 북적
7개월째 매일 1천배 ‘천일 기도’ 수행
참선 법회가 끝난 뒤 그의 처소로 올라갔다. 다래헌(茶來軒·차 마시러 오는 집)이다. 하지만 찻집의 틀에 갇혀있을 그가 아니다. “술마시는데는 도가 없고, 똥 누는데는 도가 없느냐”는 그다. 다만 이곳은 절이니 술을 마실 수 없어 차를 마실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7개월째 절 밖을 나가지 않고 매일 1천배씩 하고 있다. 천일기도다. 열여덟살에 대학입시공부를 하러 절간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선승으로부터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성철 선사에게 찾아간 뒤부터 선방 안팎을 들짐승처럼 휘젓고 다녔던 그에겐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 이제 그가 좀 달라졌을 것인지 은근히 한 질문을 던져본다.
“저는 여자를 안고 자고 일어나는데, 부대사(497~569)는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난다’(야야포불면 조조환공기·夜夜抱佛眠 朝朝還共起)고 합디다. 스님은 어떻습니까?”
“밤마다 망상으로 잠이 들고, 아침마다 망상과 함께 일어난다오.”
그가 안고 있는 것이 이미 티끌로 무화(無化)했다. 이제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하는 것 또한 망상이 되었다. 찌는 듯이 더운 지금 서울 강남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고 있다.
명진 스님은 누구?
‘역사 현장’ 함께 한 ‘청개구리 스님’
명진 스님은 삶의 궤적을 통해 그 유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청개구리과다. 1969년 해인사 백련암으로 성철 선사에게 찾아가 법명까지 받았지만, 불경을 공부하려면 일어를 공부하라고 하자, 공부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는 그날로 도망을 쳤다.
그는 5년 뒤 법주사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것도 다른 스님들은 그를 서로 상좌 삼으려 애쓰는데, 당시 주지였던 탄성 스님만 그를 ‘소 닭 보듯’하자, 굳이 탄성 스님의 상좌가 되겠다고 우겼다. 대부분의 선객들이 이름 난 선방에 이름 난 고승을 찾아가 수행할 때도 그는 충북 청원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재가자로 살아가는 ‘숨은 도인’ 여백우 처사에게 안거 때마다 찾아가 젊은날을 보내기도 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안달하는 문경 봉암사를 선승 외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산문 폐쇄를 해버린 일을 주도한 이도 그였다.
그는 85년 이곳 봉은사에서 열린 ‘10·27 법난(80년 신군부에 의해 절이 짓밟힌 사건) 규탄대회’로 감옥에 감으로써 ‘운동권 스님’으로 서막을 열었다. 그것도 감옥이 국가에서 밥먹여주고 독방까지 내주는 무문관(안에서 문을 폐쇄하고 참선 정진하는 방)이라기에 가보기를 자청한 것이었다.
그 후 그의 수행처소는 선방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한국 불교의 판도를 바꿔놓은 94년 종단 개혁 때는 수많은 비구·비구승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벗은 승복을 불전에 올린 뒤 “종단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대로 옷을 벗겠다”고 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스님들의 눈물을 쏟게 했다. 그것이 바로 종단 개혁의 시발이었다.
그는 2000년부터 조계종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과 본부장 등으로 대북 교류를 주도해왔다. 그런 그가 신도 20만의 부촌 강남의 대표적인 조계종 사찰인 봉은사 주지에 임명되자 신도들은 ‘좌익 두목’이 왔다며 경계심을 보였다. 더구나 그 자유분방한 삶의 궤적을 아는 이들은 그가 과연 대찰의 주지직을 해낼 수 있을지 의심했다.
그런 그가 막상 주지가 되자 적재적소에 인물들을 중용해 믿고 맡겼다. 마치 봉은사 주지직을 위해 출가 이후 40여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리고 지난달엔 박원순 희망제작소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봉은사 미래위원회’를 발족해 봉은사를 멋지게 꾸미고 강남의 허파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봉은’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주지가 된 직후 산문 밖엔 나가지 않겠다며 천일기도를 시작하자 뭇스님들은 “평생 다른 스님들 주머니만 털면서 살다가 이제 부촌의 대찰 주지를 맡아 놓고 밥도 안살라고 저런다”는 우스개 농담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찰의 주지가 직접 마당을 쓸고, 하루 세 번 빠짐 없이 예불을 주관하고, 산내 20여명의 스님들과 발우공양을 하는 것을 처음 본 신자들은 “저 분이 그 괴팍한 명진 스님이 맞느냐”면서 자신의 눈을 씻고 있다.
글·사진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2007년 7월 24일 제마법선사 전재
|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 512 | [제마법문] 깨달음과 신내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 2025.03.11 | 289 |
| 511 | [제마법문] 영능력자로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 | 2024.08.28 | 1066 |
| 510 | [제마법문] 강물에 녹은 달빛 | 2024.05.23 | 776 |
| 509 | [제마법문] 예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 2024.05.23 | 672 |
| 508 | [제마법문]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나 ? | 2024.04.30 | 833 |
| 507 | [제마공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 법회 개최합니다 | 2024.04.30 | 485 |
| 506 | [제마법문] 욕심이 뭔지 아시는가 ? | 2023.11.21 | 1134 |
| 505 | [제마선시] 가까운 산에 단풍놀이 가자 | 2023.11.02 | 752 |
| 504 | [제마법문] 과거세의 선인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2023.02.22 | 1556 |
| 503 | [제마법문] 무심이란 해탈을 의미합니다 | 2023.01.11 | 1478 |